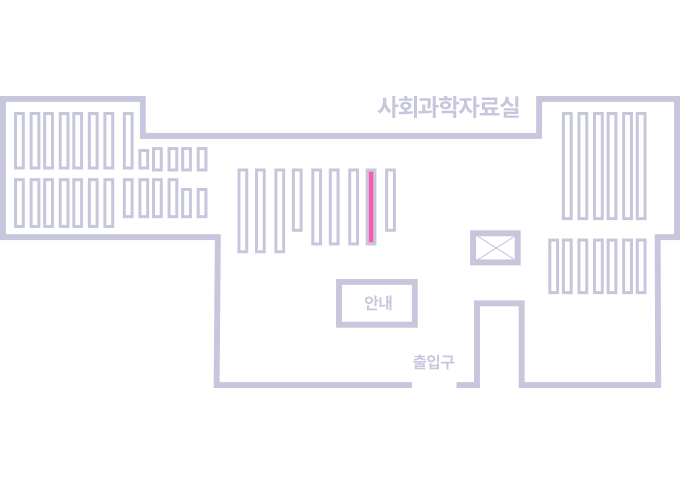[P.17~19] ◆
수경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정체를 설명할 대사를 준비했다.
“어떤 해파리는 영원히 살 수 있대. 살다 싫증이 나면 우산처럼 몸을 접고 바위에 딱 달라붙어 버린다더라. 거기서 잠깐만 웅크리고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나도 몰라. 세상 모든 일에 이유가 따라붙는 건 아니잖아. 중요한 건 걔들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종이야. 다르다면 해파리 대신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 하나겠고.”
40년 전까지 수경은 이종이었다. 지금은 이종에서 변종이 되었지만.
“그럼 해파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 먹이나 애인? 동료, 아니면 가족? 너무 인간적인 발상 아니야? 아마 가장 소중한 건 필요할 때 달라붙을 수 있는 바위일 거야. 바위를 잃은 해파리는 영생할 수 없으니까. 해파리가 유별난 게 아니라 바위가 신통한 건지도 모르고. 바위가 없으면 다른 생물들처럼 적에게 물리고 뜯기다 너덜너덜해져서 산산이 부서지겠지. 그게 나야. 바위를 잃은 해파리. 변종, 정수경.”
이 대사는 기분에 따라 주인공이 달라졌다. 휴머노이드가 될 때도 있었고, 아바타의 암리타가 될 때도 있었고, 바이러스나 히드라가 주인공일 때도 있었다. 변하지 않는 건 자신이 상상 속 무언가가 아닌 현실에 버젓이 존재하는 괴물이라는 사실이었다.
바위를 잃기 전, 이종 시절의 수경은 참으로 귀한 존재였다. 암암리에 퍼진 소문에 의하면 이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부와 명예를 얻는다고 했다. 이종을 소유하게 된 인간은 일생을 바쳐 제것을 사랑하기 마련이나, 늘 그 소유욕이 말썽이었다. 남이 내 것을 보고 마음이 동할까 두려워 별당을 지어놓고 겹겹의 문과 자물쇠를 달아 이종을 감추기 바빴다. 매일 뽀얗게 분을 칠하고 기름을 발라 머리를 빗겨주고, 비단옷에 가죽신을 신겼지만 사람들 앞에 내놓진 않았다. 이종은 별당아씨, 혹은 별당도령이란 칭호로 불리며 면사포에 감겨 방 안에서만 살았다. 그러다 문득 소유주의 마음이 식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면 태연한 얼굴로 자결했다. 댕기나 옷고름에 목을 매기도 했고, 물에 적신 창호지를 얼굴에 붙여 질식사를 택하는 일도 있었다. 이종은 스스로 곡기를 끊거나 혀를 깨물거나 벽에 머리를 찧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주를 등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