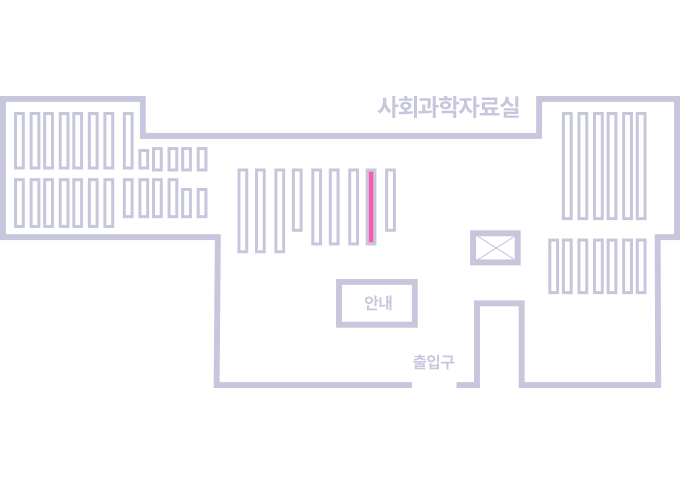두 번째로 나를 이해해 줬던 사람은 이십 대 초반에 만났던 인생 두 번째 남자친구였다. 나와는 두 살 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이십 대 중반의 그를 나는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는 때때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너무 오래간 익숙해져 버린 내 삶의 숙제들을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주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들은 엄마가 말했던 가치와 정면 대치되는 것들이 많아 혼란스러웠다. 술이 인생에 어떠한 재미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착하기만 한 착한 사람이 얼마나 실은 불행한 사람인지.
그와 연애하는 동안 엄마의 가치와 그의 가치가 정반합을 이루어, 감히 내 인생관이라 일컬을 만한 작은 의미들이 내 안에 퐁퐁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간은 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타인은 어찌 되었든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타인을 이해하기 마련이니까. 종일 빈둥대는 주말이면, 엄마는 나를 ‘할 일 없이 인터넷만 하는 중’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실은 너무 많은 할 일 앞에서 잠시간 숨을 고르는 중인데 말이다. 혹은 너무 큰 슬픔에 잠기어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무용히 시간이 흘러가는 주말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생체리듬을 가다듬는 일은 결국 나만이 내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 봄 |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중에서
“저녁은 쑥국이야.”
“아 왜! 쑥국 진짜 싫다고!”
“쑥국이 어때서?”
“으,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냄새도 싫고 느낌도 싫고! 그냥 다 싫어. 나 안 먹어!”
“그럼 국은 네 것 안 뜰게. 다른 반찬이랑 밥 먹어.”
“다른 반찬? 뭔데?”
행복했던 지난 주말 꽃 나들이의 감정은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물거품같이 사라졌고. 마주한 시간 앞에는 현실만이 일렁였다. 아침부터 새 업무와 지난주에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렇지만 봄은 봄인지. 4월의 어느 날인 오늘, 회사 급식에 쑥국이 나왔다. 쑥국이라니. 절대로 스스로 요리할 일은 없다. 쑥은 어디서 사며 쑥국은 또 어떻게 끓인담. 제철 음식을 내어놓고자 하는 취지인가. 으, 옛날 생각이 났다. 이상한 향과 미끄덩거리는 젖은 풀의 식감. 식당 가까이에 가자 잊고 지냈던 그 냄새가 났다.
줄기째 숭덩숭덩 썰려 푹 삶아진 쑥도 숟가락으로 떠 입에 넣었다. 몇 번 씹을 새도 없이 미끈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매끈하고 부들부들한 식감은 맞았지만 ‘미끄덩거리는 젖은 풀’로 격하할 만큼 나쁜 식감은 아니었다.
- 봄 | ‘쑥국을 남김없이 떠먹는 나는, 어른이 된 것 같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