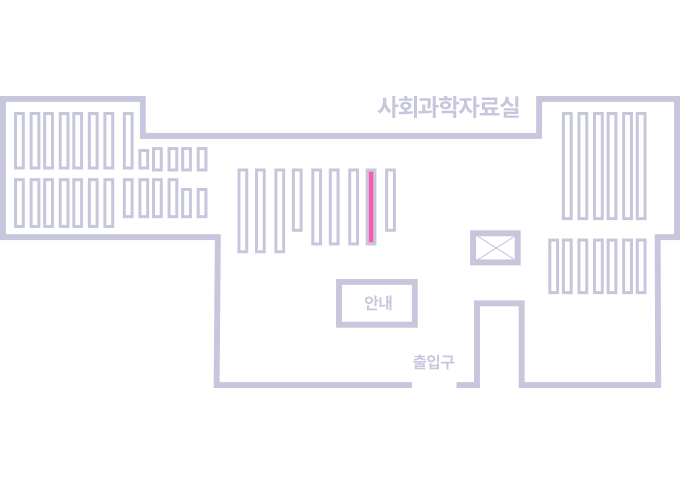사실 최근에 달러구트의 모든 관심은 가을에 진행할 어떤 ‘커다란 행사’에 쏠려 있었다. 그건 아직 가게의 직원들조차 모르는 달러구트의 야심 찬 계획이었다.
다행히 관련 업체들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몇 달 뒤에는 직원들에게도 두근거리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베드타운 가구점에서 온 마지막 편지까지 읽고 나서 뻐근한 허리를 쭉 펴며 일어났다. 침대 위에 마구잡이로 던져 놓은 편지들을 지금 당장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언제쯤 정리가 쉬워질는지…. 주말에는 대청소를 해야겠군.”
그는 청소를 미루고, 대신 한쪽 벽 전체에 딱 맞게 짜 넣은 책장 앞에 섰다. 자기 전에 침대에서 가볍게 읽을거리를 찾을 요량이었다. 그의 눈높이와 비슷한 위치에 연도가 표시된 다이어리가 순서대로 꽂혀 있었다. 달러구트는 그중에 ‘1999년’이라고 적혀 있는 다이어리를 빼 들었다.
“좋아, 행사를 열기 전에 손님들의 예전 일기도 읽어두는 게 좋겠군. 도움이 되겠어.”
다이어리는 크기가 조금씩 다른 종이들을 질긴 끈으로 엮고 겉에 커버를 달아 만든 낡은 물건이었다. 두꺼운 갱지로 만든 거칠거칠한 커버에는 얼룩덜룩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커버 한가운데 까만 잉크로 적어 놓은 ‘1999년 꿈 일기’라는 글씨는 달러구트 본인의 필체였다. 그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무언가를 손수 적거나 만드는 걸 좋아했다. 반대로, 기계를 다루는 것이 달러구트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프린터처럼 비교적 간단한 기계조차 자주 고장을 내기 일쑤라는 건 백화점의 모든 직원이 아는 사실이었다.
그는 한 손에 낡은 다이어리를 들고, 입구와 가장 가까운 침대의 이불 안으로 단숨에 쑥 들어갔다. 침구의 보들보들한 감촉이 온몸 구석구석을 와락 껴안아 주는 것 같았다. 다이어리를 펼쳐 들고 몇 장 넘기자마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다란 손가락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의 컨디션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게 일에다가 행사의 기초 준비를 혼자서 몰래 하느라 오늘치 체력은 다 써버린 듯했다.
‘젊었을 때는 남는 게 체력이었는데….’ 한숨을 푹 쉬는데 그마저도 하품이 되어 나왔다. 하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눈물까지 찔끔 흘렀다. 지금으로선 푹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것이다. 내일은 직원들의 연봉협상 일정까지 빼곡하게 잡혀 있었다. 일기는 나중에 틈틈이 읽어보기로 생각을 바꿨다.
- 프롤로그
꿈 백화점과 수많은 상점들이 위치한 중심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페니의 집이 있는 주택가가 넓게 조성되어 있었고, 북쪽은 산타클로스인 니콜라스가 사는 만년 설산, 동쪽에는 야스 누즈 오트라와 같은 유명인들이 사는 고급 주택가와 그들의 개인 꿈 제작소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아찔한 내리막’이었는데, 말 그대로 아찔하게 깎아지른 내리막을 포함해 그 주변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내리막에서 골짜기를 지나 다시 서쪽으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면,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꿈 제작사’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구역이 나왔다. 사람들은 그곳을 ‘컴퍼니 구역’이라고 불렀다.
지형이 워낙 험준하고 다른 방향으로 빙빙 돌아 접근하기에는 너무 멀었으므로, 그곳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컴퍼니 구역으로 직행하는 출근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열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을 태우고 오르막과 내리막에 놓인 레일을 따라 움직였다.
“페니, 모태일. 너희는 아직 출근 열차를 한 번도 못 타봤지?”
모그베리가 묻자 모태일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 한 번 타봤어요. 잠옷을 입은 외부 손님은 별다른 확인 없이 태워준다길래 동네 친구들이랑 시험 삼아 잠옷 차림으로 타봤죠. 차장한테 금방 들켜서 뒷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딱 10초 정도가 끝이었지만요.”
컴퍼니 구역으로 가는 출근 열차는 아무나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아니었다. 꿈 제작자 면허라든가, 구역 안에 있는 회사의 사원증처럼 ‘꿈 산업 종사자’라는 것을 증명할 신분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꿈 백화점 직원들 역시 입사한 지 만 1년이 지나야만 꿈 산업 종사자라는 걸 인정받아서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다.
- 1. 페니의 첫 번째 연봉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