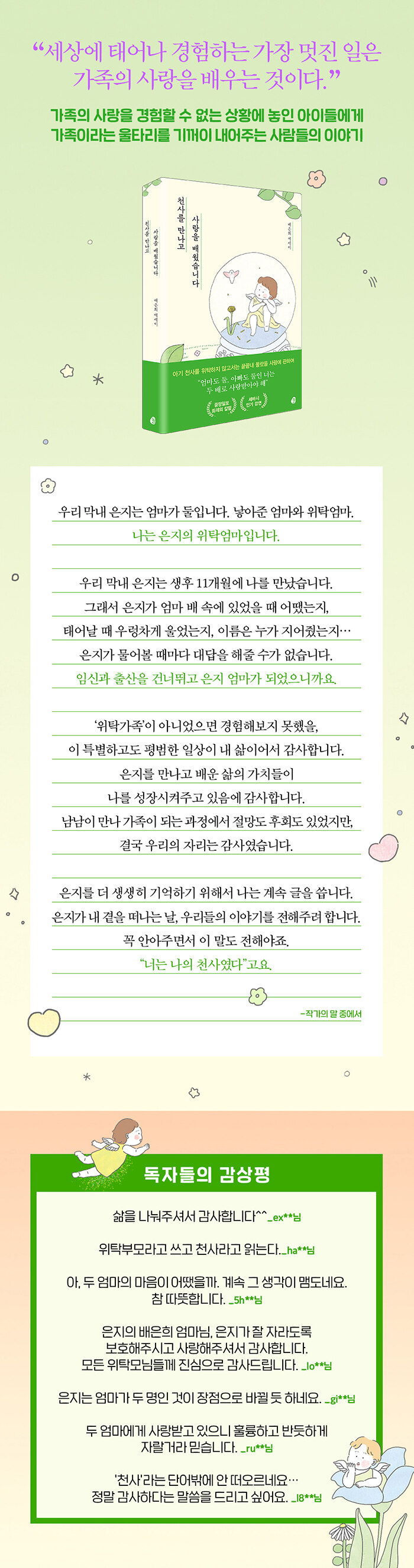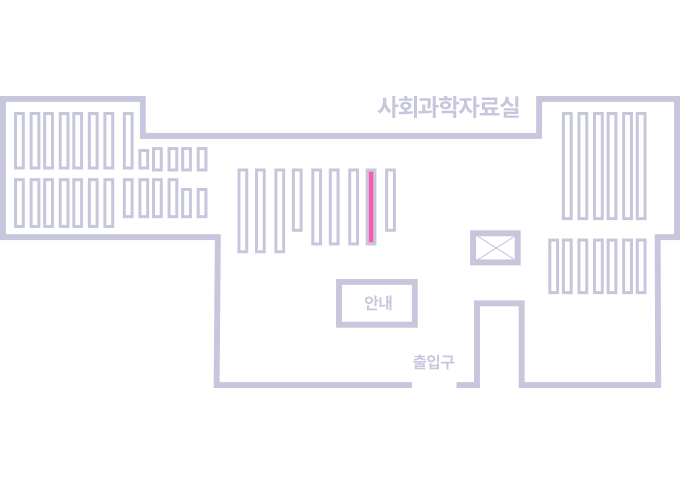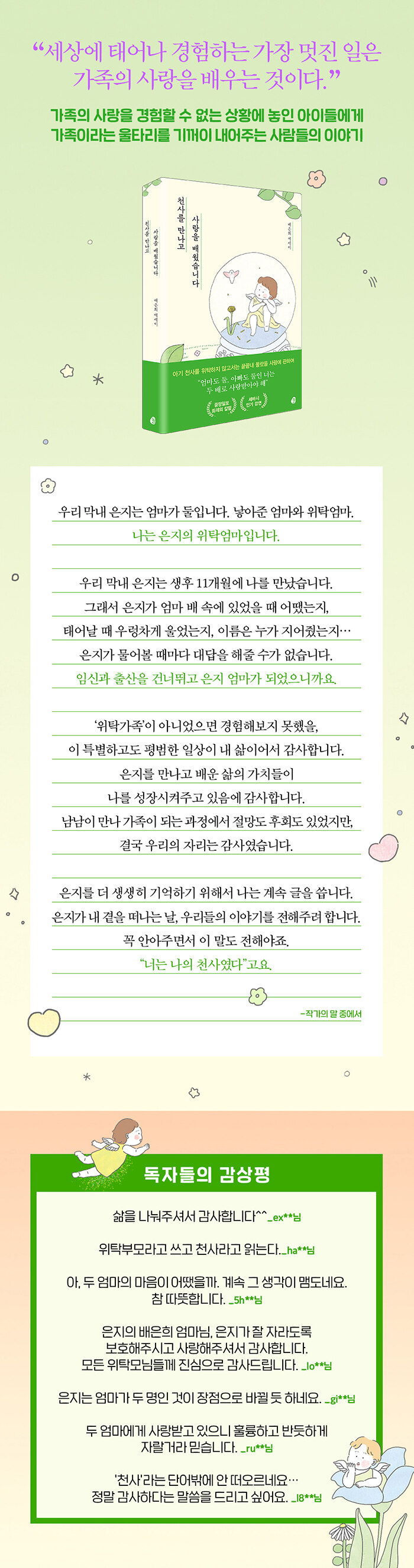
“위탁가정이 필요한 아기가 있어요.”
태어난 지 11개월 된 여자 아기인데 친엄마와 미혼모시설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퇴소 시기는 이미 지났는데 혼자서는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위탁 담당자는 나에게 조심스레 한마디를 덧붙였다. “친엄마가 지적장애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지적장애는 유전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정직하게 거절하는 게 맞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아이를… 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도 안 된 아기를 키우지?’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거절할 문장들을 만들었다 지우고, 만들었다 지웠다. 고민 끝에 가족들과 함께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만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주말, 나와 남편과 두 아이가 모두 모여 앉았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아이를 물건 사듯이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다음엔 어떤 아이든 받아들이자고. 그 약속이 생각나더라고.”
“엄마… 잊지 마.”
스무 살의 어린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모성은 누구와도 다르지 않았다. 꾸역꾸역 슬픔을 삼키며 아기를 쓰다듬던 손끝까지 젖어 있었다.
차에 탄 뒤에도, 은지 엄마에게 자꾸만 시선이 갔다. 아이를 안고 있는 나에게 책임감의 무게가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은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출발해야 했다. 은지 엄마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점점 멀어지는 우리를 한참이나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기를 안고 집으로 오는 내내 그 어린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