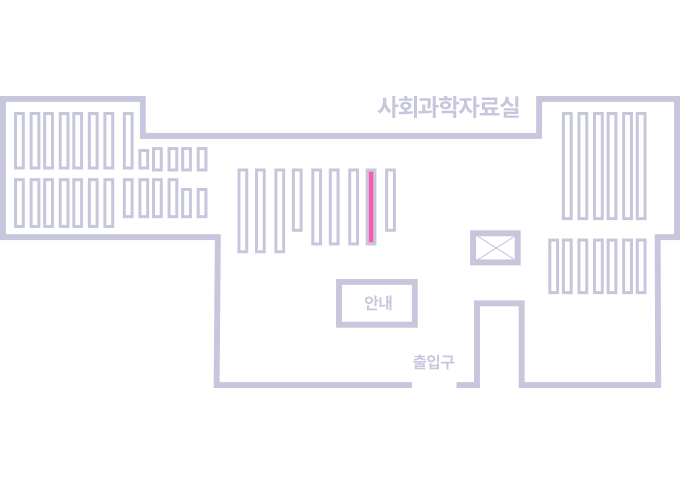[P. 22~23] “그동안 밀린 보험료가 23만 원인데 그 돈을 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
“23만 원 가지고 다시 오세요.”
고등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10만 원이던 시절이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엄마는 며칠 동안 이곳저곳으로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다. 가끔 병원에 가기 위해서 내야 할 그렇게 큰돈은 없었다.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나에게 동사무소 직원은 돈을 가지고 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동사무소에서 돌아 나오는 골목은 하염없이 길게 느껴졌다.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햇살이 얼굴을 가득 채웠지만 갑자기 터진 울음에 눈물을 닦아내느라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어야만 했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걸로는 당장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엄마도 내가 대학에 가길 원했지만 재수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내 성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가 되어야 했다.
그 짧은 순간 떠오른 게 ‘간호사’였다. 그러면 의료보험이 없어도 웬만한 치료는 내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때 그렇게 간호사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세상물정 모르는 생각이었지만 나는 그만큼 간절했다. 그때 내 나이는 겨우 열여덟 살이었다.
[P. 36~37] “야, 뭐해? 니 환자잖아!!”
달려온 선배들은 기관 내 삽관을 준비하고 주치의를 불렀다. 또 다른 선배 하나가 멍하게 서 있는 나를 대신해 환자의 가슴 위로 뛰어올라 심장을 힘껏 누르며 소리쳤다.
“뭐해! 에피네프린 하나, 빨리!!!”
주사기로 약을 재는 내 손이 떨고 있었다. 선배들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고비를 넘겼지만 나는 선배에게 심한 질책을 들어야 했다.
“넌 대체 뭐하는 거야!! 네 환자 하마터면 잃을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야. 알겠어?”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랬다. 그 환자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서투르고 겁에 질린 나 때문에.
한껏 움츠러든 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선배의 격앙된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4분이면 죽는 거야, 뇌는. 그러면 살아난다 해도 평생 누워서만 지내야 돼. 환자의 심장이 멎을 때마다 담당 간호사가 얼어붙어서 시간을 지체할수록 환자는 그렇게 되는 거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우선은 무조건 달라붙어. 달려들라고. 너와 네 환자 사이가 가까울수록 네 환자는 살아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 후로 나는 심폐소생술이 시작되면 무조건 환자에게 달라붙었다. 당황해서 할 일이 떠오르지 않아도 몸으로 먼저 달려들었다. 선배의 말이 옳았다. 멈춘 심장을 누를 때마다 간절히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를 살리기 위해 뭘 해야 할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은 빠르고 자연스럽게 내 몸으로 배어 들어갔다. 정말 가까이 있어야 그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 그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