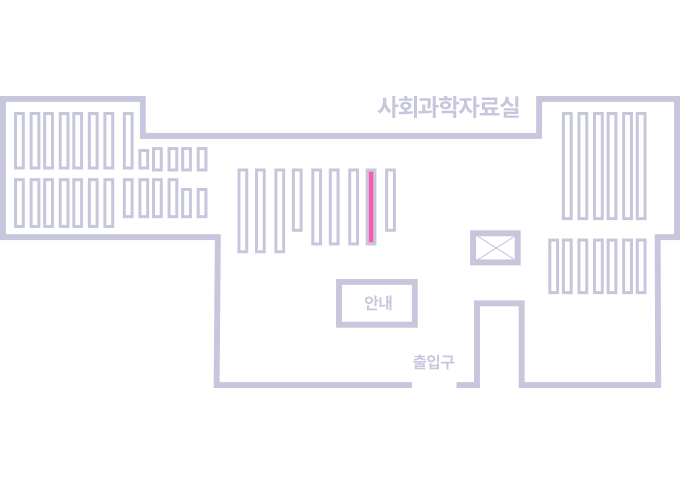[P. 21~22]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충남 금산의 시골 마을로 향하는 사람이, 경북 문경의 산 아래 집에 사는 사람에게 갖는 궁금증이랄까요. 주말 시골살이를 시작한 후, 저는 매 계절의 경계를 종종거리며 계절을 마중하고 또 배웅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이 하는 크고 작은 일에 감탄하며 무언갈 기록하고요. 자주 봤지만 이름을 몰랐던 식물의 이름을 외우려 애쓰고, 마당과 뒷산을 오가는 동물들의 얼굴을 익히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곁에 두고 사는 행복을 누리다가, 어느 날 마을 한구석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줄곧 도시에서 살 때와는 다르게 무언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사라지는 일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기쁨이자 슬픔입니다.
작가님의 기쁨과 슬픔 또한 궁금합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익숙한 이야기를 간솔하게 나누고픈 마음, 또 다른 생각을 전해주실 거란 기대를 담아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작가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먹고, 생각하고, 느끼시나요? 그곳의 행복과 고충은 무엇인가요? 작가님 또한 제가 머무는 이곳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동시에 이제 막 프리랜서의 세계에 진입한 이가, 선배 프리랜서에게 갖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골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날들은 어떠신가요? ‘시골’이라는 공간과 ‘프리랜서’라는 일의 형태가 합쳐진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많은 질문을 던져두고 답장을 청해봅니다. 단번에 답하시기엔 꽤 많은 질문들이니, 앞으로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천천히 답해주세요.
_ 김미리, 윤수에게
[P. 54~55] 아무리 방임형 텃밭이라고 해도 한없이 늘어지는 줄기들을 지주대에 묶어주어야 하고, 누렇게 시들어버린 죽은 잎사귀를 정리해야 하고, 과실이 너무 익기 전에 따주어야 하잖아요. 눈에 보일 때마다 틈틈이 했다면 일이 크지도 않을 텐데, 비도 오고 바쁘단 핑계로 몇 주 손 놓고 미루니 저 조그만 텃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텃밭을 보고 있노라면 여름방학 내내 일기를 한 장도 쓰지 않았는데 내일 개학인 초등학생의 마음처럼 무겁고 막막했죠.
그래서 한동안 집업실을 외면했어요.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비가 너무 많이 와 집업실로 가는 길이 유실된 탓이 컸지만, 가방을 풀기도 전에 어떻게 좀 해보라며 아우성칠 텃밭을 마주하면 가뜩이나 가득 찬 부담감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비가 잠잠해지고 날이 개서 집업실에 돌아왔어요. 짬을 내어 늘어진 토마토 줄기도 정리하고, 시들어버린 오이 잎도 잘라내고, 잡초도 조금 쥐어뜯고요. 저녁이 되어 마루와 마을을 거닐었는데요. 새삼 좋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다른 구름과 노을 색을 보며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최근엔 일에 잠식되어 들판을 봐도 기쁘지 않고, 하늘을 봐도 ‘그냥 이렇게 하루가 훌쩍 가버렸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네요.
모처럼 맑게 개인 시골 마을을 크게 한 바퀴 걷다보니 ‘이 아쉬운 계절을 7월 내 한 번도 못 보다 오늘에서야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어느새 앞서 걷는 마루가 보였어요. 똥땅똥땅 거닐며 신나게 냄새를 맡는 하얀 강아지가요.
그 이후 잡초는 못 뽑더라도 이 시골을 많이 걸어야지 생각했어요. 제게 필요했던 휴식은 이 시골 마을의 고요한 걸음 속에 있구나 싶어서요. 핸드폰 그만 보고, 일 생각 그만하고, 그저 걷고, 하늘을 보고, 벼와 마루의 궁뎅이를 보고 말이죠. 이 생각도 “바빠, 바빠”를 입에 달고 살 때는 또다시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짐하려고요.
“자주 걷자. 이 시골길을, 이 계절을. 마루의 저 귀여운 걸음걸이를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걷자.”
_ 귀찮, 이 편지를 펼쳐 볼 땐 맑은 날이길 바라요